[서평] 집은 인권이다 [예전 글]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16-07-13 13:08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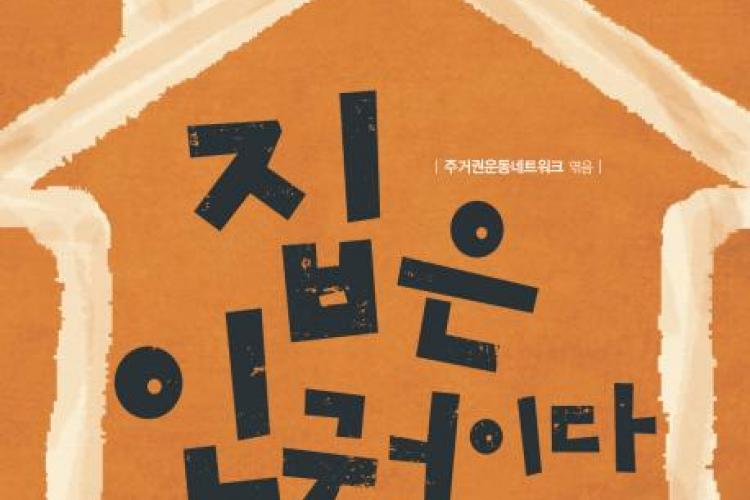
이상한 책이 한 권 나왔다. 삶의 보금자리 때문에 이런 저런 설움을 기록한 책인데, 저자들 어법은 밝고 경쾌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상한 책은 소설 ‘장석조네 사람들’이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2010년 버전이다. 책을 읽는 내내 작은 미소가 내 입가를 떠나지 않을 것을 보면 말이다.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순이가 가질 수 없던 ‘희망’을 여전히 저버리지 않은 저자들의 낭만과 여유로움이 있다. 집 없는 설움이 유머로 승화됐다고 해야 하나.
이상한 책은 엉뚱한 주장을 한다. 집이 인권이라고…. 세상에, 집이 인권? 사람들은 말한다. 집은 사는 거라고.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공급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인 ‘집은 사는 것이 나니라 사는 곳’이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부동산 불패신앙의 유일신을 믿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그런 말은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이 인권이라니….
이 이상한 책을 한마디로 평하자면, ‘걱정거리’ 혹은 ‘느그는 집 없이 살 수 있나?’ 집은 걱정거리다. 억대의 대출을 끼고 어렵게 집을 마련한 사람도 하우스푸어로 전락할까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걱정거리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대란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이삿짐을 싸야하는 전세임차인에게도 걱정거리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집은 인권이다. 부자에게도 빈자에게도,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도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은 기본권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권을 제약당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한 마디 충고를 듣는다. “더러우면 돈 벌어 집을 사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정치적 자유권만을 갖고 국민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사회권의 충족과 보장도 국민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사회권 중 대표적인 기본권이 바로 주거권일진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민과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해왔다. 아니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쌍팔년도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용산에서 벌어진 참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보살펴야할 국가가 오히려 주거약자들을 배척하고 내동댕이친 현대사를 우리는 온전히 기억한다. 상계동 올림픽의 주민들, 목동의 주민들, 사당동의 주민들, 봉천동의 주민들… 수많은 동네의 수많은 주민들이 버려지고 짓밟힌 그 비참한 철거의 역사를 용산참사는 다시 떠올리게 했다. 개발의 논리로 철거민을 청소하던 국가는 요즘 들어 ‘뉴타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대란의 풍랑으로 몰아간다.
B씨는 장위뉴타운에 거주하는 주택세입자였다. 장위뉴타운은 지난 2008년 3월 4일 결정고시(정비구역지정)가 발표되었고, 2007년 6월14일 구역지정공람공고를 한 재정비촉진구역이다. B씨는 2007년 3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오랫동안 장위뉴타운에서 거주한 세입자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마른하늘에 벼락 치는 소리를 건넸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주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것이다. B씨의 경우 장위뉴타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입주권은 물론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이사비)를 모두 받을 자격이 되는 세입자였다. B씨는 막막했다.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갖고서는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B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보증금을 올려줄 돈도 없었던 그로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가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뉴타운발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전세금이 너무 올라 결국 경기도 외곽에 간신히 전세방을 구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도 있다. A군은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여 이문동에 자취방을 전세로 계약하였다. 계약기간은 졸업 때까지로 맞춰서 2년 계약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은 왔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바뀐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자녀가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쓰려고 그 집을 샀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뉴타운 지역이라서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사정 좀 봐달라고 했다고 한다. 추측건대, 집주인은 자식들에게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빼고 자식들을 입주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이야기에 담긴 여러 사연들을 한 세입자가 겪은 사례들이다. 이게 지금의 세태이자 현실인 것이다. 세입자는 약자이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은 있으나마나 하다. 그래서인지 저자 중 한명은 이렇게 외친다. “꼴값, 이름값도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이라고 말이다.
꽤 오래전 기억이다. 지금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삼양동. 내 유년시절의 기억이 온전히 담긴 곳이다. 김소진의 소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무대이기도 한 동네. 도시빈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은 없었다. 아! 물론 거주할 ‘공간’의 있었다, 임대로. 소유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집 없는 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잦은 이사, 월세 걱정, 집주인의 위세….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웃 간의 정이 넘쳐났다. 내 유년시절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그 동네는 속칭 ‘판자촌’이었다. 사소한 갈등으로 집 없는 설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동네였다. 그 동네는 공동체였기에 희망이 살아있었다.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70~80년대 판자촌과 산동네에는 있었지만, 2010년 뉴타운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
